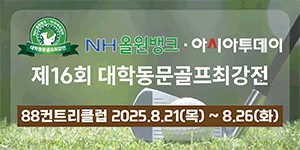|
이는 분명 비슷한 사건인데 번번이 다른 결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조씨처럼 가족을 살해한 김성관은 2017년 10월 신상 공개가 됐다. 김성관은 당시 경기 용인 처인구에서 어머니와 새 아버지, 이부동생을 살해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측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며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경우 유족 반대가 있었지만, 정반대로 판단했던 것이다.
지난해 9월에도 잔인한 두 사건이 엇갈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의 최성우(28)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백모(37)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모호한 기준 탓이다.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판단 근거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누가 심의하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다. 중대한, 충분한, 공공의 이익 전부 주관적인 표현들이다. 이렇다 보니 사건마다 의아한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신상 공개가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일관돼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 형평성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아예 전국 단위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중지를 모으지 않는다면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머그샷: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상태에서 촬영하는 사진.